
필연과 꿈의 긴장은 그 둘 사이의 화해를 요구합니다. 마법의 열쇠로 어두컴컴한 필연이란 監獄의 자물쇠를 열고 그곳에서 탈출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빛나는 꿈의 城을 몽상할 뿐입니다. 열쇠공 진철이 그렇습니다. 닫힌 남의 집 문은 귀신같이 열어도, 자신의 답답한 현실로부터 탈출할 열쇠는 정작 쥐고 있지 못합니다. 그의 아내와 큰 딸은 집을 나갔습니다. 가족이 아파트에서 함께 오순도순 살아 보겠다는 꿈, 지구 반대편에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해보겠다는 소박한 꿈은 그저 꿈꾸기에 그칠 뿐입니다. 이러한 꿈과 현실간의 괴리가 가져오는 긴장은 어느새 진철에게 냉랭한 체념으로 전환됩니다. 그런데 진철의 폐쇄된 우리에 열쇠구멍 같은 크기로 한 줄기 빛이 스며듭니다. 신문사 편집 기자인 진철의 작은 딸 은서가 살던 집의 계약 만료로 새 집을 구하기 전까지 진철과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창 없는 방의 벽에 붙어 있는 환상적인 푸른 바다와 하늘이 그려진 달력 그림을 바라보며 몽상에 젖어 있던 진철의 마음에 봄날의 따뜻함이 다시 스며듭니다. 은서를 위해 복숭아 김치를 담그고 핑크색 수건을 준비합니다. 밤 늦게 퇴근하는 은서를 지하철역까지 마중 나갑니다. 이렇게 진철을

제도 도입은 이해관계자들 간의 이익 충돌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제도 도입으로 한 집단의 이익이 높아지면, 또 다른 집단 의 이익이 감소하는 음(-)의 상관관계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제도 개혁의 성패는 이해관계들 간의 이익 조정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이에 대한 실례의 하나입니다. 과로사 위험이 가중되고 있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원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근로시간단축이 법제화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경쟁력 약화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도 저성장 저물가라는 작금의 글로벌 경제 상황에서 경제 분야의 핵심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 확대에 대한 논의 배경 근로시간단축이 가져오는 이해 관계자들 간의 이해 상충관계에 대한 해법으로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의 확대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즉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의 논의는 2018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주52시간 근로상한제한의 법제화로부터 비롯됩니다. 주당 최다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의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의 삶의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간 법안 중 검경수사권조정에 대한 여야의 견해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사법개혁을 둘러싼 논쟁은 준사법기관으로 검찰에 한정할 것인가, 아니면 검찰외의 기관, 예컨대 공소권을 갖춘 공수처를 추가로 허용할 것인가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즉 한편에선 세계 어디에도 공소권을 가진 공수처 같은 준사법기관은 없다라는 주장에 대해, 또 다른 쪽에선 세계에 유례가 없는 입법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할 정도로 무소불위의 검찰이 사회문제의 최종심판자로 나서고 있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 기소권을 보유한 공수처를 지지하는 논거 기소권을 보유한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한 논거는, 로마법언 또는 common law의 언급처럼, 일반적으로 자기 정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수사권 및 기소권이 있는 기관이 검찰을 통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심판자이면서 당사자로서 활동할 수 없으므로, 사람은 자신의 사건에 대한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로마법언)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는 경우에 자기 사건을 자신이 조사 할 수 없다.”(미국 common law)] 즉 자기편 사건을 자기기관이 제대로 수사, 기소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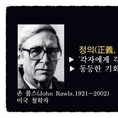
‘각자에게 그의 (정당한) 몫을’ 우리는 이 正義의 개념을 포기할 수 없는 가치체계로 이해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존엄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형식이 ‘빈 껍질’에 지나지 않는다는 깨달음에 곧 이르게 됩니다. 형식을 채우는 내용은 우리의 열정과 의지에 달려있다고 믿어왔습니다. 때문에 고된 노력, 뜨거운 갈망으로 각자의 몫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라는 과녁에의 명중 여부는 개인에게 주어진 조건인 활과 화살의 우수함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곧 이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불공정한 조건에 대해 ‘정의가 있는가?’라고 분노하지만, 그 분노를 곧 거두고 운명에 순응합니다. 자연의 우연한 작용이라는 運의 위력에 의해, 열정에 대한 응분의 대가는 얻어 질 수 없다는 체념에 젖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운은 나의 의지와 분리된 힘이라는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건에 대한 의문과 공정사회에 대한 열망 그간 2개월여 간, 우리는 출생의 조건이 낳는 왜곡된 사회 구조를 씁쓸하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운이 정당한가에 의문을 품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컨대 어떤 농부가 정성껏 농사를 지었는데 예측하지 못한 태풍과 홍수로 농사를

1990년대 이후 부상한 라틴아메리카의 좌파정부들이 우파 정당들에게 정권을 빼앗기며 퇴조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선 현재 극우 성향 정당인 사회자유당의 자이르 메시아스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정권을 맡고 있습니다. 보우소나루대통령은 '브라질의 도널드 트럼프', '열대의 도널드 트럼프'라고 불릴 정도로 극우 정치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칠레에선 현재 좌파 성향의 미첼 바첼레트 대통령을 이어 중도 우파성향의 세바스티안 피녜라가 대통령입니다. 그는 억만장자로 ‘칠레의 트럼프’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라틴아메리카의 다수의 유권자들이 좌파 정부와 결별하고 우파 정당을 지지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틴 아메리카 좌파 정부의 퇴보, 그 원인은? (이상현외) 우선 유권자들의 좌파정부에 대한 반감은 좌파정부의 평등 지향적 정책과는 무관하다는 지적입니다. 과거 좌파정부의 부상은 극심한 빈부격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를 극복해 달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좌파정부의 정권획득으로 이어졌고, 좌파정부는 극빈층의 지원정책〔브라질 룰라정부의 볼사 파밀리아(Bolsa Familia), 베네수엘라의 미션(Misión), 아르헨티나의 헤페스 이 헤파스 데 오가르(Jefes y Jefa

사회전체의 행복을 위해 개인과 소수자의 이익과 권리는 침해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논리에 따르면, 정의도 목적이 아닌 사회적 행복을 높이는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논리는 결과주의와 전체주의에 빠진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때문에 롤즈(J. Rawls)는 다수자의 기본적 자유의 확보를 위해, 개인 특히 소수자의 기본적 자유를 희생하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 이와 같은 결과주의와 전체주의를 야기하는 사상은 존 스튜어트 밀(J.S. Mill)의 정의관으로부터 비롯됩니다. ◆ 밀의 정의관 어떤 지역의 국회의원이 일부 유권자들에게 돈을 주고 당선되었습니다. 그 지역외의 전체 유권자들은 그 국회의원에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그 의원은 자신의 공적(功績)으로 당선 된 것이 아니며, 무엇보다 정당하게 선거운동을 한 다른 후보들의 이익을 빼앗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유권자들의 불만을 없애기 위한 방법은 그 의원이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밀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행동은 처벌받아야 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언제나 기쁨과 만족을 안겨준다.”라고 지적합니다. 이처럼 정의에는 공적에 따른 분배, 위반에 대한 사람들의 분노,
오늘의 곡 “Hungry Eyes”는 영화 <더티 댄싱(Dirty Dancing)(1987)>의 OST입니다. <더티 댄싱>은 의사 아버지를 둔 베이비(제니퍼 그레이)와 댄스 교사인 자니(페트릭 스웨이즈)의 계층을 뛰어넘는 사랑을 그린 영화입니다. 두 사람은 구별된 각자의 세상에 속해 있지만, 계급을 구분하는 높은 장벽을 허물고, 상대를 갈망하는 눈으로 바라봅니다. 에릭 카멘(Eric Carmen)이 부릅니다. “Hungry Eyes” https://www.youtube.com/watch?v=6oKUTOLSeMM ◇ I've been meaning to tell you I've got this feelin' that won't subside I look at you and I fantasize You're mine tonight Now I've got you in my sights 당신에게 말하고 싶었어요.(아직 말 못했지만) 이 감정이 가라않지 않는다고... 당신을 바라보고 상상하지요. 오늘 밤, 당신은 나의 것 지금 당신은 나의 꿈이지요. *I've been meaning to tell you [이 문장은 "I wanted to te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사회적 약자에게 꿈같은 소리입니다. 부모의 경제자본과 문화자본(예컨대 부모의 학력, 부모의 인맥, 입시에 대한 정보력)이 자녀의 고상한 취향과 스펙이라는 아비투스, 즉 문화자본을 축적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부모의 힘에 의해 만들어진 자녀의 문화자본이 명문 대학입학이란 문화자본을 낳습니다. 이는 다시 신분상승이란 문화자본과 고소득의 경제자본으로 이어집니다. 이러니, ‘개천에서 용 난다’는 것은 이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학종의 성격 부모의 경제자본과 문화자본이 빛을 발하는 분야가 대학입시 전형의 하나인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입니다. 학종이 활성화 된 때는 MB정부 시절입니다. 학종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입학사정관제는 이명박정부 시절 학생 부담과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정부 방침 아래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강력한 의지 속에서 추진되었습니다. 2014년부터는 교육부의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과 맞물려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한 학생 모집 비율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성적을 우선으로 선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꿈과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입시 제도로써 기대를 모았습니다.
"Don't stop believing. Hold on to that feelin’-믿음을 멈추지 마, 그 느낌을 꽉 잡으라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 믿음을 부여잡습니다. 이 믿음의 끈을 놓아 버린다면, 나는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힘을 신뢰하기에, “Oh, the movie never ends. It goes on and on, and on, and on-영화는 절대로 끝나지 않아. 그건 계속해서 이어지지.”라며 자신이 그리는 영화를 계속 찍어갑니다.그리고 마침내 영화를 완성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겠죠. 이 노래의 제목인 ‘Don't stop believing’의 아이디어는 미국의 록 밴드 <Journey>에서 키보드를 담당하는 Jonathan Cain의 아버지에게 빚지고 있습니다. 조나단의 아버지는 Los Angeles의 Sunset Boulevard에서 뮤지션으로 살아갔는데요, 뮤지션으로서의 성공을 꿈꾸며 그의 아들 조나단에게 곧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Don't stop believing or you're done, dude." (믿음을 멈추지 마. 안 그러면 넌 끝이야. 이 녀석아) 마음으로 자신만의 영화를 찍고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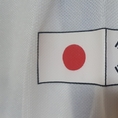
“서쪽 이웃에서 빌린 돈을 동쪽 이웃에게 독촉한다.” 이 같은 심리는 ‘억압의 移讓’이라는 원리로, 일본의 제국주의 팽창정책을 적절히 설명하는 논리입니다. 억압의 이양이란 위로부터의 고통이 아래로의 쾌감에 의해 상쇄된다는 균형이론을 말합니다. 자신에게 압박이 가해질 때,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자신보다 못한 주변을 압박한다는 것입니다. 달리말해 이는 강자로부터의 억압감을 주변의 약자로 이양하여, 강자로부터 당한 피해의 고통을 주변의 약자들을 억압해 얻는 가해의 쾌감으로 보상받고자하는 심리를 말합니다. 억압의 이양은 일본 제국주의의 아시아 침략의 논리가 됩니다. 아베총리가 정신적 지주로 존경해 마지않는 동향(야마구치현, 죠슈번)의 요시다 쇼인(吉田松陰)은 억압이양의 원리에 근거하여 征韓論을 주창하였습니다. 개항이후 열강의 중압감을 끊임없이 피부로 느끼고 있던 쇼인은 일본의 장래를 아시아에 대한 제국주의 침략에서 구하자고 주장한 것입니다. 앞에서의 치욕을 뒤쪽의 유쾌함에 의해 보상받고자 한 것입니다. 특히 일본제국주의의 조선 병합의 논리도 억압의 이양으로 읽혀집니다. 1890년 3월 제1회 제국의회에서 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수상은 일본의 안전보장을 위해서는
오늘의 곡 “Complicated”는 캐나다 출신의 싱어송라이터 겸 배우인 에이브릴 라빈(Avril Lavigne,1984~)의 데뷔 싱글인데요. 불과 17세의 나이에 발표한 곡입니다. 이 노래 말의 키워드로, ‘fake, honesty, relax’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relax에 이르기 위해선 ‘You fall and you crawl and you break’해야 한다고 라빈은 노래하네요. 17세 소녀의 인생철학, 한번 들어보실래요? https://youtu.be/5NPBIwQyPWE ◇ Uh huh, life's like this Uh huh, uh huh, that's the way it is 'Cause life's like this Uh huh, uh huh that's the way it is 맞아, 인생은 이런거야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지 왜냐면 인생은 이런 거니까 그래, 그렇게 흘러가는 거야 ◇ Chill out, what you yellin' for? Lay back, it's all been done before And if you could only let it be You will see 진정해, 왜 소리 지르는 거야 긴장 하지

1차 세계대전 당시 서부 전선의 여러 곳에서, 적군끼리 공격을 자제하는 모습이 역력하였습니다. 심지어 독일군들이 영국군의 소총 사정거리 내에서 태연하게 걸어 다녔고, 영국군들은 그것을 보고도 신경을 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전선에서 어떻게 적군끼리 ‘공존공영’이 가능 했을까요? ◆협력의 조건은 배반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미국의 정치학자 로버트 액설로드는 그 이유를 상호작용의 계속성에서 찾습니다. 당시 공존이 가능했던 전선은 참호전에서 서로 오랜 기간 대치하고 있던 영토들이었습니다. 참호전의 소부대 병력은 상당한 기간 동안 어쩔 수 없이 얼굴을 맞대고 상호작용을 해야 했습니다. 이들은 서로의 관계가 오래 지속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상호작용의 지속은 협력에는 협력으로, 배반에는 배반으로 갚는 신사적인 호혜주의(눈에는 눈, 이에는 이 :Tit for Tat)가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상호작용이 곧 끝날 것 같다면 협력 대신 배반이 정답입니다.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 둘 다 배반하면 둘 다 1의 수익을 얻습니다. 또한 내가 배반하고 상대가 협력하면 자신은 5의 수익을, 상대는 0의 수익을 얻습니다. 때문에 나는 어떤 경우에든 배반의